마지막 배심원, John Grisham 작 (배경: 1970년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소도시) ----
(백인 언론인인 주인공 윌리는 취재차 알게된 점잖은 흑인 노부인인 칼리의 점심에 정기적으로 초대됩니다.)
세번째 점심 초대에는 포트로스트 (potroast, 약한 불에 천천히 찜을 한 쇠고기: 역주)가 나왔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현관에서 식사를 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포트로스트 역시 생전 먹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미스 칼리가 조리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식탁 중앙에 놓인 커다란 쇠 냄비의 뚜껑을 열었다. 진한 향기가 확 풍겨 올라왔고, 그녀가 눈을 감고 향을 맡았다. 잠에서 깬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나는 식탁보라도 먹어치울 수 있을 만큼 배가 고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요리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둔살을 떼어 기름기를 남겨 둔 채로 냄비 바닥에 놓는다. 그런 다음 감자, 양파, 순무, 당근, 그리고 사탕무를 얹고, 소금과 후추와 물을 조금 넣는다. 그렇게 준비된 것을 오븐에 넣고 약한 불로 다섯 시간 동안 굽는다.
그녀가 쇠고기와 야채를 내 접시에 풍성히 담아 주었다. 그리고 걸쭉한 소스를 끼얹어 주었다.
"사탕무를 넣어서 희미하게 자줏빛이 나요." 그녀가 설명했다.
...중략...
"성경은 자주 읽는 편인가요 ?"
"아뇨." 내가 뜨거운 순무를 씹으며 고개를 저었다.
----------------------------------------------------------------------------
저는 존 그리셤 소설을 맨처음 작품,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The Firm)'서부터 단박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전문성, 어색하지 않고 빠른 전개,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인간 관계, 냉소적인 유머 감각, 억지로 설득하거나 교훈을 주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 스토리, 주인공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먹을 것 이야기...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려서 꽤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듣도보도 못한 음식 이야기를 책에서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마 국민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톰 소여의 모험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톰과 그 일당들이 가출해서 어느 무인도에서 저녁을 해먹는 장면에서 '베이컨을 구워 옥수수빵의 저녁 식사를 했다' 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께 베이컨이 뭐냐, 베이컨이라는 것을 구우면 옥수수빵이 되는 것이냐, 옥수수빵은 보통 식빵하고 뭐가 틀리냐 등등을 꼬치꼬치 여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께서 정확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할아버지께서도 정확하게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1970년대였고, 우리집은 특별히 좀더 가난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전체가 가난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나중에 제가 (비록 아반떼지만) 자가용을 몰게 되고 (비록 회사 출장이지만) 해외여행도 다니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존 그리셤 소설은 아마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딱 하나, 제목이 뭐드라... 아무튼 그리셤이 약간 실망스러웠던 '불법의 제왕' 이후에 난데없이 첩보소설 들고 나타난 것을 보고 '얘도 갈 때까지 갔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도서관을 뒤지다보니 2004년도에 '최후의 배심원'을 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북스 사에서 출판했고, 저도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읽었습니다. (출판사 분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책 광고 해드리고 있으니 이해하십쇼.) 아, 여러분들도 아직 안 읽으셨으면 읽어보십시요. 정말 오리지널 존 그리셤답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남부 소도시의 살인사건에 얽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예전 작품에 비해 음울한 분위기보다는 밝고 익살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고, 또 (주로 미국 남부식) 먹을 것 이야기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용한 저 포트로스트라는 음식은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쇠고기찜 정도에 해당하나봐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요리가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튀기는 게 건강에 나쁜 것은 알겠는데, 굽는 게 왜 ? 라는 분이 있다면 [07호] 매트릭스와 스테이크 ( http://paper.cyworld.com/storyfood/216887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인 미스 칼리가 하는 말처럼, 정말 요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 제가 요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원래 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 언듯 머리 속으로 그려보아도, 저렇게 재료들을 쇠냄비에 집어넣고 5시간 동안 불 위에 올려놓으면 바닥에 깔린 재료가 새카맣게 타버릴 것 같습니다. 곰국 같은 거 고을 때도 거의 하루 종일을 살피면서 증발해버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계속 부어주쟎아요. 그런데 저 소설 속의 요리는 정말 별 수고가 안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쉬운 요리법의 핵심은 '오븐에 넣고' 라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저희 집에도 오븐이 있기는 합니다. 저나 와이프나 한때 제빵제과에 필이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필이 꽂히게 된 배경에는, 이거 해봐서 뭔가 소질이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있다면, 스트레스받는 회사 때려치우고 빵집 한번 차려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안있어 제빵제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걍 얌전히 회사다니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고는 그 필이 피시식 꺼져버렸습니다.
( 저희집 것은 이 모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븐은 그 이후에도 종종 사용됩니다. 저희 집은 20평대 아파트라서 좁거든요. 그래서 가스오븐은 못사고, 들롱기인가 하는 이탈리아제 전기오븐을 샀습니다. 한 13~17만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광고 많이 하네.) 저희 가족은 집안 물건에 대한 지출이 매우 적은 편인데, 이 전기오븐은 정말 본전을 뽑은 것 같습니다. 닭 구워먹거나, 냉동만두 구워먹거나, 얼려놓은 남은 음식 해동하거나 베이글 구워먹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또 이런저런 요리할 때 와이프가 아주 편리하게 잘 씁니다. 전자오븐을 쓰면 음식이 말라버리거나 국물이 탁 터지면서 튀는 것에 비해, 오븐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이 오븐 산 이후로는 전자오븐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와이프 말에 따르면, 서양 애들은 정말 편하겠다는 거에요. 뭔가 뚝딱뚝딱 재료를 준비해서 오븐에 넣어 둔 뒤 잊어버리면 되니까 말이에요.
또 저 요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순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흠... 저는 논산 신병 훈련소에서 지겹도록 먹은 이후로는 무를 삶은 요리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특히 생선과 무를 함께 삶은 것은 정말 최악의 요리로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종종 나오는 반찬이 깡통에 꺼낸 정어리와 무를 함께 삶은 것인데,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회갈색 무더기는 지금 생각해도 토 나옵니다. 훈련소 이후 카투사 복무 시작하면서는 다행히 미군 애들 음식에서 무를 구경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양 애들도 순무를 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양 음식 중 순무를 먹어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서양 애들도 논산 훈련소에서 식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어쨌거나 저 요리법을 읽어보면, '마늘과 간장과 생강이 빠졌으므로 무효'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 서양 애들은 오븐을 발명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제일 중요한 양념들에 있어서는 후진적이기 짝이 없네요. 여러분, 고기 요리는 한국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믿으십시요.
'이야기 속의 음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바도스와 꼬냑, 위스키의 공통점 그리고 전통주 (1) | 2009.08.29 |
|---|---|
| The Battler, 그리고 뜨거운 샌드위치 (0) | 2009.08.29 |
| 수호지, 그리고 생선의 보존 (0) | 2009.08.29 |
| 무기여 잘있거라, 그런데 롤빵은 ? (0) | 2009.08.29 |
| Sharpe는 내장 요리를 좋아해 (0) | 2009.08.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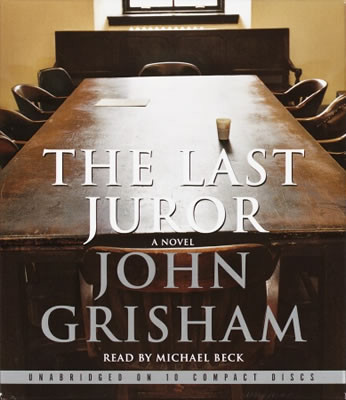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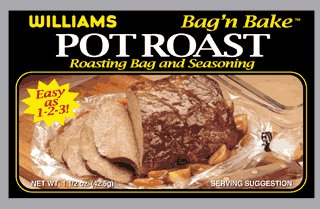





댓글